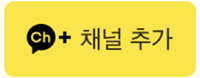개요
망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49세 때인 2008년 10월부터 8년 4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2월에 원발성 폐암(선암, T1bN2M1a, stageIV)을 진단받고, 2018년 4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49세 때인 2008년 10월부터 8년 4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2월에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망 근로자 ○○○이 생전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수행한 업무는 병원 내 시설관리 업무로 영선반에서는 혼자서 일을 도맡아서 수행하였는데, 천장배관, 지하실 발전기, 각종 전기작업 및 수도배관 노후와 펌프의 과부하로 인한 관리, 의료기기/전자제품 및 각종 비품의 A/S 및 용접작업도 병행하였다고 한다. 요양병원은 완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보온재가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낙후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석면 보온재를 직접 뜯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월평균 2~3회 정도인데, 잦은 경우 이틀에 한 번씩 작업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천장재가 텍스이기 때문에 전구를 교체할 때에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요양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병원시설의 전반적인 보수 업무, 소방/전기/설비 등 위탁업체 관리업무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병원시설의 공사나 큰 보수가 필요한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전기/소방/산업안전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도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큰 공사에서는 망 근로자 ○○○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한편, 배식카 바퀴 수선을 위해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요양병원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28병상으로 층별 면적이 약 120평 정도인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인데, 망 근로자 ○○○이 요양병원에서 수행한 업무는 병원 내 시설관리 업무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다. 병원 내 시설관리 업무는 건물 내 누수점검 및 배관교체, 전기설비 수리, 의료기기・전자제품 및 각종 비품의 A/S 및 용접작업, 형광등 교체, 간단한 설비 공사 및 설비 공사의 발주 및 감독, 소방 및 전기, 산업안전 점검, 형광등 교체 등 병원 설비가 유지되기 위한 작업 및 병동에서 요청하는 수리작업 등 매우 다양하다. 작업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점심시간(12:30~13:30)을 제외하고 약 9시간이며,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였으며 퇴근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병원에 일이 생기면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서 망 근로자 ○○○이 근무당시 작성한 작업일지를 일부 확보하여 검토하였으며,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하루에 3~5개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별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지만 한 가지 작업 내용을 1건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망 근로자 ○○○이 휴직하기 전인 3월까지 3개월간의 작업내용도 확인하였으며, ‘지하 행정원장실 천장 텍스 교체 설치’ 5회를 제외하고 2014년 작업내용과 유사하였다.
작업내용 및 작업빈도는 현재 망 근로자 ○○○이 수행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작업자의 진술과 유사하였는데, 각 병동에서 고쳐달라는 의뢰가 오면 가서 직접 수리를 하거나 외부에 의뢰하여 수리하는 ‘병원 집기 및 출입문, 화장실, 시설 설치 및 수리, 형광등(LED) 교체 및 수리, 각종 청소 및 수리’ 작업의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누전 차단 점검 및 수리, 병동 전선 전리 및 전기 제품 수리 및 설치’ 가 그 다음으로 빈도가 많았다. 그 외 각종 공사의 감독이나 엘리베이터 보수 및 점검, 천장 누수관련 점검 및 보수, 전기, 소방, 산업안전 월례점검 등의 순이었다. 용접작업의 경우 작업일지 상의 빈도는 약 한 달에 2~3회로, 현재 담당자인 작업자의 진술인 일주일에 2~3회 보다 적었는데, 다른 수리 및 설치 작업에서 작업일지에 포함되지 않는 용접작업이 수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용접작업 중 배식카의 바퀴, 문 등을 용접하는 작업이 전체 용접작업의 70~80%라고 진술하였으며, 배식카의 바퀴, 문과 같이 간단히 붙이는 작업은 5~10분이면 마무리되고, 그 외 제작하는 것은 반나절 동안 작업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용접작업 위치가 지금은 실외에 위치해 있으나 2013년 지하 2층을 재활치료실로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주로 사무실과 배관실이 위치해 있던 지하 2층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한편, 2014년에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장재인 텍스에서는 대부분 백석면이 4~5% 검출되었으며. 탈의실, 약제실, 정화조계단실의 벽재인 밤라이트에서 백석면이 약 10%, 기계실 배관의 가스켓에서 백석면이 15% 검출된 바 있다.
질병력
- 개인력
1989년에 결혼한 유족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0년 8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다고 한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84년 3월에 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였다고 한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1988년 8월에 B사업장에 입사하여 6개월간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가 1989년 4월부터 2개월간 C사업장 서울지점에서 근무하였고(작업내용 미상), 1989년 5월부터 2년 4개월간 D사업장 모터사업부에서 사무업무를 보았고, 1992년 9월부터 E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보았다.
1996년 4월부터 3년 6개월간 종합병원, 2002년 5월부터 약 1년간 의원에서 사무업무를 보다가 2006년 9월부터 에폭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H사업장에서 자재과 사무 업무를 보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2008년 10월부터 8년 4개월간 요양병원에서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A대학병원 작업관련성 평가서에서는 흡연력이 12갑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2주 전부터 호흡곤란과 좌측 흉부 불편감이 있어 2017년 2월 13일에 B병원을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좌폐상엽 종괴가 확인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월 13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B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가 좌폐상엽에 2.9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면서 폐에서 폐로의 전이도 의심되었는데, 흉수 세포진 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었다. 2월 15일에 흉막의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선암이 확인되어 양전자방출단층영상(2. 16)/뇌 자기공명영상(2. 17)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종격동 림프절, 좌측 흉막, 뇌(다발)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1bN2M1a,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후 2월 23일에 퇴원하였고, 3월 6일에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외래를 재방문하여 경구 항암제(Erlotinib)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5월 2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폐상엽 종괴 및 종격동 림프절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7월 17일 영상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7월 17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도 뇌전이 병변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나 연수막(leptomeninges)에 새로운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다. 9월 25일 및 12월 4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및 뇌 영상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11월경부터 시야 장애가 시작되었는데, 2018년 1월경부터 청력이 소실되면서 이명이 발생하였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여 경구 항암제 복용을 중단한 후 1월 18일에 A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1월 19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연수막의 전이 병변이 더 악화되었고, 1월 30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2017. 12. 4)과 비교하여 좌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악성 흉수도 증가하였다.
A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2월 13일에 C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의식은 혼미한 상태에서 1월 20일부터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 비위관(Levin tube)을 통해 경관식을 시작하였는데, 보호자가 다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해 2월 19일에 A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A대학병원으로 전원한 당일인 2월 19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20일 전(1. 30) 영상과 비교하여 좌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고 우폐상엽에 새로운 간유리 음영 및 양폐하엽에 경화 소견이 관찰되어 비경구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항생제 투여로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흉부 영상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사망하기 5일 전인 4월 5일에 C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다.
C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활력징후도 이상이 없었으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도 95% 정도로 유지되었는데, 부착형 마약성 진통제 및 분당 3 L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이틀 후인 4월 7일부터 의식이 반혼수(semi-coma) 상태로 저하되었고,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다가 4월 10일에 사망하였다.
결론
①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에 이미 종격동 림프절, 좌측 흉막, 뇌(다발)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1bN2M1a, stageIV)으로 확진된 이후 뇌로 전이된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49세 때인 2008년 10월부터 8년 4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 흄 및 석면의 누적 노출량이 적고,
③ 요양병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시작한 후 조직검사로 폐암이 확진되기까지 잠복기 또한 다소 짧다.
'직업성 질환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1년간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화학섬유 제직공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0) | 2022.01.29 |
|---|---|
| 26년간 취부작업, 조선소 철의장품 설치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0) | 2022.01.27 |
| 34년간 외과와 영상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전문의에서 발생한 폐암 (0) | 2022.01.21 |
| 21년간 여러 도금공장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2.01.20 |
| 11년동안 탄광 굴진부에서 굴진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0) | 2022.01.18 |